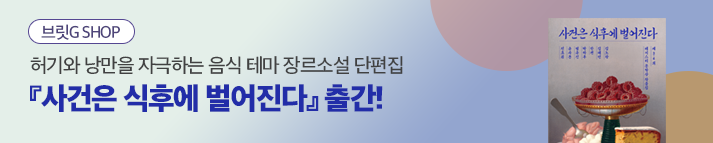이 이야기는 경기도 광주에서 일어났던 살인 사건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 보고서라 해야 하겠지만, 그 전에 자칭 한국의 유일한 강력 사건 전담 탐정이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덜 떨어진 대식가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다.
대한민국에는 아직 강력 사건에 관여할 수 있는 공인된 사립탐정이 없기 때문에 이 인간과 내 무용담은 경찰의 사건 기록엔 등장도 하지 않는 데다가 이 녀석에게 들어간 내 월급을 생각해서라도 공 서진이라는 인간과 동행하며 겪은 사건들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남겨두는 일종의 취재 기록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일단 내 소개를 하자면 이름은 양 희주, K일보의 사회부 기자다.
주로 강력 사건을 맡고 있는데, 입사 2년차의 조무래기에게 떨어지는 사건은 범인이 이미 자수한 존속 살해사건이나 아니면 그야말로 동기도 단서도 없이 희생자와 범인만 있는 묻지마 살인(대체 누구한테 묻지 말라는 거야) 정도다.
어려서부터 강력반 형사인 아버지를 따라 수사 기법과 범죄 심리학을 공부한 나에게 어울리는 사건이 좀체로 오지 않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 수사에 자신이 있으면 수사관이 되지 왜 기자가 되었느냐고 물을 수 있을 텐데, 사실 내가 몸이 좀 약하다.
입이 좀 짧고 먹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지라 학창 시절 반에서 키를 재면 나보다 작은 여학생도 없을 정도였다.
이름을 여성스럽게 지어서 그런 게 아니냐며 할아버지가 항상 안타까운 시선으로 날 보셨지만
아니에요, 할아버지. 이름을 마 동석이나 이 소룡으로 지으셨어도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비쩍 곯은 마 동석이 하나 생기는 것 뿐이죠.
그 날은 아무런 감흥도 생기지 않는 사건을 하나 맡아서 남양주의 아파트로 향하던 길이었다.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자기 집에서 밖으로 화분을 던져서 지나던 행인의 어깨에 떨어진 사건이었다.
최근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편집장은 이 사건까지 묶어서 특집기사로 한 번 내보라고 나를 닦달했다.
“요즘 할 게 없어서 광화문 근처 맛집 찾아 다닌다며?
이거 두 개를 엮고 게임 중독이랑 인터넷 방송까지 한데 묶어서 특집기사 한번 내봐.”
“인터넷 방송은 무슨 상관인데요…”
“최근에 폭력적이고 욕설이 난무하는 BJ들이 난무하고 있다고 만수가 특집 기사 한 번 냈잖아.
걔한테 도움 좀 받고 게임 중독은 관련 학과 교수 한 명 찾아서 인터뷰 따고.”
“애가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너무 과하게 부풀리면 그 애한테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일은 초반에 이슈화시켜야 관심이라도 좀 끌 수 있어.
아이에 관련된 신상 정보는 철저히 블라인드 처리하면 되지, 안 그래?”
하기 싫다는 표정과 제스쳐를 수십회 보내다 포기한 나는 주차장에서 15년도 더된 구닥다리 각 그랜져의 시동을 걸었다.
내 고충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벗인 이 검은 친구는 아버지가 심혈을 기울여 관리를 한 덕인지 물려 받은 지 몇 년이 되었건만 잔고장 한번 나지 않았다.
그래, 오늘은 뭔가 느낌이 좋으니까.
아침부터 하늘을 가득 메웠던 구름도 걷히고 파란 하늘이 끝도 없이 펼쳐진 오후였다.
평일 한가한 시간이건만 근처에 도로 공사라도 있는 건지 서울을 벗어나는 데 40분 가까이 걸려서 기분이 꿀꿀해진 난 기분 전환을 위해 CD플레이어의 플레이 버튼을 눌렀다.
QUEEN의 ‘I was born to love you’를 들으며 신나게 외곽도로를 달리고 있던 내 옆으로 익숙한 실루엣의 둔탁한 차량이 쏜살같이 내 차를 추월하는 게 보였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지만 뒤 따르는 승용차에 사이렌이 달려 있는 걸 보니 경기도 광역 수사대 승합차가 분명했다.
아버지에게 물려 받은 사건 냄새를 맡는 후각이 내 코를 자극했다.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