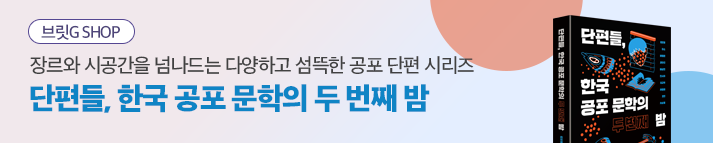이곳은 어둡다. 상투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 공기는 미지근하고 텁텁해서 숨을 들이쉴 때마다 불쾌해진다. 무언가에 질척하게 짓눌리는 듯한 착각마저 든다. 어둠에도 밀도가 있다면 이곳의 어둠의 밀도는 공기보다 빽빽할 것이다. 나와 주위 승객들은 어둠속에 가라앉아있다. 간신히 휴대폰으로 지금 시간을 본다. 오전 11시.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 시간만 보고 바로 화면을 끈다. 간간히 주위를 비출 휴대폰 액정조차 없다면 나는 한치 앞도 볼 수 없다. 어떤 밤도 여기처럼 어둡지는 않다. 시력에 의존하지 못하는 만큼 다른 감각이 점점 예민해져갔다. 청각이 그랬고, 배고픔이 그랬다. 꼬박 하루 동안을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점점 공복감을 참기 힘들었지만, 지금 먹기에는 상황이 좋지 않다. 가방 안에 든 빵을 먹을 좋은 타이밍이 언젠가는 올 것이다.
지하철 안에 갇힌 지도 거의 하루가 다 되어간다. 의자에 몸을 파묻는다. 옆 사람과 어깨가 마주 닿는다. 조금 몸을 뒤척여 심기의 불편함을 알린다. 그나마도 의자에 앉아있는 게 다행으로, 일어서서 타고 있던 사람들은 일찌감치 바닥에 퍼질러 앉아있다. 모두들 밥은커녕 물 한모금도 마시지 못했다. 아직까지는 괜찮다. 곧 구조 될 것이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지만 마음은 그렇게 편해지지 않는다. 무릎 위에 올려둔 가방을 꼭 끌어안았다. 빵 봉지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얼른 손에 준 힘을 풀었다. 그리 큰소리는 아니었다. 아무도 듣지 않았을 거라 스스로 위로한다. 평상시라면 모를까 모두가 굶은 상태에서 나 혼자 빵을 대놓고 먹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곧 구조가 오겠지만, 정말 만에 하나 구조가 늦어진다면 이 빵 한 봉지는 내 생명줄이 될 것이다.
(중략)
2008년 일본 근처의 해구에서 새로운 심해어가 발견되었다. 수심 7700m에서 발견된 이 물고기는, 공식적으로 발견된 가장 깊은 곳에서 헤엄치는 물고기이다. 우윳빛 올챙이처럼 생긴 그 물고기는 바닥을 기듯 헤엄치며 바닥에 떨어진 물고기 사체를 뜯어먹고 산다. 평범한 해저지대에서 깎아지른 듯 아래로 떨어지는 해구는 그 자체로 하나의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어져있지 않는 이상 교류가 있을 턱이 없기 때문에 해구에서 발견된 생물은 그곳에서만 있는 고유의 종이라 봐도 무방하다. 일년 뒤 2009년, 뉴질랜드 근처 7500m 해구에서 또 하나의 종이 발견된다. 그 물고기는 일본근처 해구에서 발견된 종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생김새가 같았다. 하지만 그 둘은 생김새만 같을 뿐, 전혀 다른 종이라 과학자들을 당황케 했다. 과학자들은 일정 깊이 해구에선 모든 어류가 같은 생김새로 진화할 것이라는 가설만 세웠을 뿐 정확한 답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종이 원래 가진 습성과 유전적 특징도 가혹한 환경 아래에선 쉽게 바뀌는 것인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