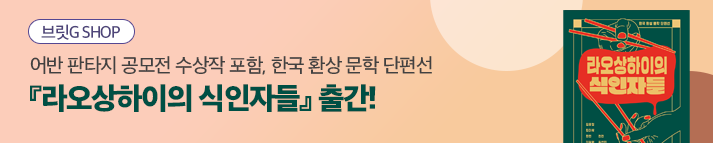순자 씨는 화장실 청소만 십오 년 넘게 한 베테랑이었다. 남편이 사고로 죽고 그녀 혼자서 남매를 키워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시작했던 청소 일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었다. 아이들을 모두 출가시킨 뒤에도 순자 씨는 일을 그만두지 못했다.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고 싶지 않다는 이유도 있지만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화장실 청소라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청소 일은 계약직으로 고용되기 때문에 한군데 진득하게 있지를 못하고 번번이 일자리를 옮겨 다녀야 했다. 대형 마트 화장실을 청소 할 때도 있었고, 백화점 화장실을 청소할 때도 있었고, 대학교 화장실을 청소할 때도 있었다. 3개월 전부터는 지하철로 파견되어 화장실을 청소했다. 일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청소를 할 때가 마음이 편했다.
그녀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복장을 갖추어 입은 뒤 고무장갑을 끼고 청소 도구를 챙겨 남자 화장실로 갔다. 화장실을 들어서니 승객 몇 명이 소변기에 몸을 붙이고 소변을 보고 있었다. 순자 씨는 익숙하게 장갑을 다시 매만지고 숨을 크게 들이 쉬었다. 그녀는 화장실과 동화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공간 속으로 녹아들어 갔다. 남자화장실에서 순자 씨를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남자들은 묵묵히 자신이 볼일을 보고, 그녀는 청소를 할 뿐이었다.
순자 씨는 자신이 청소 일을 시작한지 십년 정도 지났을 때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방법을 깨닫게 되었다. 청소와 동시에 자연스럽게 주변의 환경과 동화되었다. 청소에 집중을 할수록 사람들은 그녀의 존재를 느끼지 못했다. 순자 씨는 남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이 익숙했다.
그 날도 늦은 시간까지 청소를 하고 열시가 넘어서야 일이 끝났다. 도구를 가지런히 정리하고 청소 유니폼을 사물함에 넣은 뒤 짐을 챙겨서 나가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그녀를 부르는 것이었다.
“김 여사.”
뒤를 돌아보니 시설점검을 담당 하는 이 여사였다. 금테 안경을 쓴 뾰족한 얼굴에 마른 몸을 가진 이 여사는 순자 씨를 보더니 조용히 손짓을 했다.
“시간이 됐어요.”
“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시유.”
“어머님께서 기다리세요.”
이 여사는 순자 씨의 대답을 듣지 않고 몸을 돌렸다. 두 여인은 관리직원들만 들어 갈 수 있는 통제구역을 통해 지하철 선로 쪽으로 나 있는 임시 통로로 은밀히 내려갔다. 이 여사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면서 벽 구석에 교묘히 숨겨져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불을 켜니 크기가 작은 직원용 화장실이었다.
이 여사는 순자 씨에게 손짓을 했다. 그녀는 화장실 끝의 도구창고 쪽으로 다가갔다. 살짝 열린 문 사이로 어지럽혀진 청소도구들이 보였다. 이여사가 도구창고 문을 닫고 입구 쪽으로 가서 화장실 불을 껐다. 창문도 없는 지하 화장실이다 보니 빛 한 점 들어오지 않았다. 이 여사는 다시 돌아와 조심스레 도구 창고 문을 두드렸다. 단단한 울림이 화장실을 채웠다.
곧 끼익 소리와 함께 도구함 문이 열렸다.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손전등의 가는 불빛이 순자 씨와 이여사의 얼굴을 비추었다. 순자 씨가 손바닥으로 빛을 가리고 눈을 가늘게 뜨고 보니 여자 화장실을 담당하는 서 씨가 문 안에서 슥 얼굴을 내민 것이었다.
“언니가 왜 여기 있슈?”
서 씨는 대답하지 않고 순자 씨 얼굴을 한 참 보더니 들어오라며 손짓을 하는 것이었다.
“따라오세요.”
“잠깐만유. 거기 좁아서, 우리 다 못 들어갈,,”
도구함 문이 열리자 깜깜한 어둠 속 안에 긴 복도가 이어져 있었다. 서 씨가 앞장서고 이여사가 뒤를 따랐다. 순자 씨는 어리둥절하며 이 여사의 뒤를 쫓았다. 서 씨의 작은 손전등 불빛에만 의지해 복도를 걸어갔다. 순자 씨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과 마주하자 으스스한 느낌이 들었다.
곧 복도 끝에 유리문이 나타났다. 문 위에는 거의 다 떨어진 ‘목욕’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있다. 서 씨가 두터운 유리문을 두드렸다. 곧 문이 열리고 역시나 손전등을 든 여인이 고개를 내밀었다. 순자 씨도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그녀는 서 씨와 이 여사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다. 세 여인이 들어오자 유리문이 닫쳤다.
“이게 뭔 일이래.”
순자 씨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주변을 살폈다. 손전등 빛에 의지해 살펴본 문 안쪽은 오래 전에 폐쇄된 목욕탕이었다. 남탕 쪽은 이미 문이 떨어지고, 공사를 하다가 중단했는지 군데군데 철거를 한 흔적들이 보였다. 서 씨가 그들을 안내한 곳은 ‘여성전용 빨래터’라고 적힌 곳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군데군데 타일이 떨어져 나간 빈 수조들과 쌓여 있는 오래된 빨래판들이 있었다. 구석에 모아둔 옷가지나 잡동사니들을 지나치니 가운데의 거대한 공동 빨래 터 안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모두 각자 손전등을 하나씩 든 채 원 모양으로 빙 둘러 서있었다. 순자 씨가 아는 이들도 있었고 처음 보는 얼굴도 있었다. 복도를 청소하는 구 씨, 이전에 같이 파견 갔던 신 씨와 박 씨…….
“어서 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