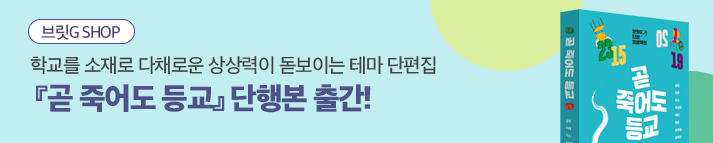1.
장이 죽었다.
사인은 자살이었지만, 우리 축구부원들은 누가 실제로 그를 죽였는 지 알고 있었다. 우리 말고도 꽤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 바다를 끼고 있는 소도시에 불행한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곳에서 불행이란, 오늘이 어제와 다르다고 느끼는 것이었고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단지 별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한다. 불행한 사람들은 서울에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리소문 없이 제 발로 사라지거나 바닥에 엎드려서 희미해져 갔다.
아주 가끔 숨길 수 없는 큰 일이 터질 때가 있다. 그럴 때, 한 순간 동안만 날 것 그대로의 말과 이야기들이 온 동네를 큰 파도처럼 휩쓴다. 그러나 결국 그것들은 잠잠해지고, 얼마 뒤 조금씩 다른 이야기들이 저녁 해무처럼 동네를 슬금슬금 돌기 시작한다. 대개 그 이야기들은 피해자들 사정이 딱하기는 하지만 알고 보니 그럴 만도 했다는 식으로 흘러가게 마련이었다. 그렇게 안개 낀 밤을 보내고 맞은 날은 다시 수많은 어제들과 비슷해졌고 사람들은 안심할 수 있었다.
모두 그렇게 살았다.
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고등학생 한 명이 산 속에서 목을 맨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지만, 일어날 수 없는 일도 아니었다. 게다가 그의 아버지는 죽은 지 오래 였고, 어머니는 캄보디아에서 온 사람이었다. 공부 머리가 없어서 운동을 했고, 그 역시 시원 찮아서 대학 지명을 받지 못한 젊은이. 반은 한국, 반은 동남아 피가 흐르는 그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없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신 적이 있다.
“어릴 때 죽은 친구는 그냥 잊어버리게 돼. 몇 년 지나면 이름과 얼굴도 기억이 안 나더라. 어린 나이에 받아 들이기에는 너무 큰 일이라 마음이 그냥 지워버리는 거지.”
과연 그럴까, 장이 죽은 여름에서부터 늦은 가을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그 모든 일들을 잊을 수 있을까. 잊혀진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국 내 속 어딘가에 있는 검은 연못에서 자고 있을 것이다. 이것을 쓰는 이유를 자연스럽게 말하게 되는 것 같다. 나는 죽은 친구를 그리워하거나 추모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다. 어느 날 내 안의 검은 연못에 있는 것이 기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나는 쓴다.
2.
장과 나는 중학교에서 처음 만났다. 그저 그런 중학 축구부에 동기로 들어간 우리는 금방 친해졌다. 동지의식 같은 것이리라. 여기 같은 소도시에서 운동부 생활을 한다는 것은 공부 머리는 없는 것으로 낙인찍히는 것이었고 나중에 읍내에서 건들거리거나 서울로 도망갈 놈들 취급을 받는 것이다. 장과 나는 그런 밑바닥에서도 가장 밑에 있는 신세였다. 이제 수염이 나기 시작하기 시작하는 나이의 우리에게 선배들의 구타와 괴롭힘이 쏟아졌지만, 그 덕분에 장과 나는 더욱 친해졌고 고등학교까지 같이 가게 되었다.
고등학교까지 이어진 축구부 생활이 즐거웠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더이상 괴롭다고 느끼지는 않았다. 학교 밖에서든, 교실이든, 운동부 합숙소든 어디에나 폭력은 있었고 그것을 피해가는 사람은 여기 먹이 사슬 위에 올라 앉은 사람들과 그 자식들이었다.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은 별난 사람이 되는 것이었고 곧 불행해질 사람들이었다. 그런 식으로 장과 나, 우리 동기 모두들은 그렇게 살았고 나름 마음 편하게 지냈다. 하지만 학교라는 곳은 그 안의 사람을 씹어서 물렁거리게 만들고 어른이라는 딱지를 붙인 다음 뱉어 내는 곳이다. 우리는 충분히 물렁해 졌고 이제 쫓겨 날 때가 되고 있었다.
장과 나는 수비수였고 운동장보다 벤치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았다. 가끔 도내 대회에서 교체 멤버로 출장하긴 했지만 전국대회에서는 뛰어본 적도 없었다. 2학년 겨울 방학부터 나와 장은, 그리고 비슷한 신세의 동기들은 장의 집에 모여 빈둥거렸다. 모두 3학년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마음을 정하라는 성화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런 말 하지 않는 어머니가 있는 장의 집이 제일 좋은 곳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때 그 겨울 방학이 가장 좋았다. 바깥에는 칼 바람이 불었지만 우리는 장의 방에 모여 밤새도록 시답잖은 잡담을 지껄이며 뒹굴었다. 그리고 한번씩 장의 어머니가 해주시는 동남아 식 야식과 주전부리를 먹어 치웠다.
봄이 왔고 우리는 3학년이 되었다. 각자 운동을 때려 치울 이유를 수만 가지씩 준비하고 참석한 첫 훈련 때 감독은 새로 코치가 올 것이라고 발표했다
“경험은 없지만, 너희들에게 도움이 될거다.”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곧 알게 되었다. 당뇨가 점점 심해지는 감독은 조만 간에 은퇴할 예정이었고 그 전에 재단 이사장 아들이 코치로 들어와서 팀을 인수받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재단은 중학교부터 대학까지 가지고 있는 도내에서 가장 큰 사학재단이었고 그 대학의 축구팀은 특례입학을 통해 끌어모은 몇 몇 선수 덕에 그럭저럭 이름이 알려진 팀이었다.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한 것은 그 대학으로 특례입학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다.
코치가 오던 날, 운동장에 도열한 우리는 모두 나름 기대에 차 있었다. 감독과 함께 우리 앞에 선 코치는 선글라스를 끼고 몸에 달라붙는 화려한 운동복을 입고 있었다. 우리의 경례를 받은 그는 감독의 소개와 훈시가 있을 때 짝다리를 짚은 채 건들거렸다. 잠시 후 감독이 코치에게 훈련일지를 넘겨주고 교무실로 들어가자 그가 우리 앞에 허리를 짚은 채 섰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내가 기억력이 별로라서 말이야.” 그는 얇은 입술 끝을 찌그러뜨리며 말했다.
“한 명씩 자기 성명하고 포지션 복창해 봐”
왼쪽 끝의 주장부터 시작된 복창은 장의 차례에 까지 왔다. 장이 이름과 포지션을 말하려고 할 때 코치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리고 장 앞에 섰다.
“넌 뭐야?”.
그가 선글라스를 벗고 장을 위아래로 훑어 보았다.
“깜둥이네. 잘 뛰냐?”
그리고 악몽이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