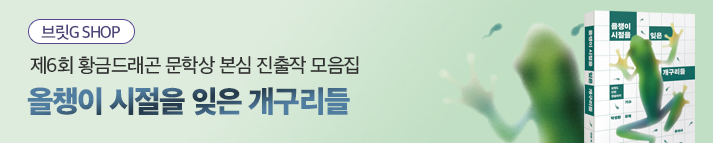모든 웅덩이는 ‘알 수 없는 바다’와 이어져 있다.
…보통 사람은 심도1 수준의 바다에만 들어가도 목숨을 잃게 마련이다. 텐타클은 바닷속에서 더 빠르게 움직인다.
…훈련받은 특수잠수사는 심도3까지 내려가는 것이 가능하다. 인간의 몸으로 내려갈 수 있는 심도의 한계는 5까지로 알려져 있다.
—
민간소속 특수잠수사 이해랑 씨는 졸린 눈을 비비며 칫솔을 입에 물었다. 전날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는 바람에 전국 곳곳에 웅덩이가 많이 생겼을 것이다. 그 말인 즉, 할 일이 많다는 의미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이야 평탄화와 우수제거시설도 잘 되어있으니 큰 문제가 아니겠지만 지방은 아직도 비가 온 후에 사람이 사라지니까.
비가 오는 건 천재지변이라고 쳐도 물 받아놓은 싱크대나 세면대, 욕조, 심지어 세숫대야에서도 촉수가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다. 물론 확률적으로 아주아주 드문 케이스다. 그래도 이제는 주방이나 화장실이나 물 고이는 일 없게 다 건식으로 만드는데…
「 …숨을 후 내쉬면서 팔을 그대로 천천히 쭈욱 내려줍니다. 」
해랑의 나쁜 버릇이라면 나쁜 버릇인데, 양치질을 하면서 딴짓을 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래서 그날도 거실에 서서 아침방송에서 나오는 스트레칭을 멍청하니 따라하고 있던 해랑이었다.
아무튼, 재수가 정말 더럽게 없으면 양치질용 물컵에서도 무언가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다. 여태까지는 한 번도 없던 일이지만… 그것도 움푹 패인 곳에 고여 있는 물이라는 거지.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평화로운 요가음악을 배경으로, 화장실 세면대 옆에 놓아둔 물컵에서 무언가가 꿀렁꿀렁 흘러나왔다. ‘웅덩이’에서 나오긴 했으나 해랑이 흔히 제거하는 텐타클(tentacle촉수)의 모양새가 아니었다.
해랑이 양치질하는 것도 까먹고 어떻게든 팔관절을 늘려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이, 컵의 부피를 훌쩍 넘게 흘러나온 그것은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슬라임처럼 흐물거리며 부엌으로 움직였다.
부엌 식탁 위에는 새벽배송으로 받은 먹을거리들이 미처 냉장고로 들어가지 못하고 어지럽게 널려있었다. 슬라임 같은 액체는 식탁다리를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다.
「 난나나난나 나나나나나~♪ 」
아침방송이 끝나고 유산균 광고가 나오기 시작하자 그제야 해랑은 칫솔을 움직이며 돌아섰고
“어아아(엄마야)!”
식탁 앞에 서서 생고기를 우물거리고 있는 청년과 눈이 마주쳤다. 해랑은 깜짝 놀라서 칫솔로 목구멍을 찌를 뻔했다. 청년이 생고기를 씹어 삼킴과 동시에 해랑은 입안의 치약거품을 저도 모르게 꿀꺽 삼켰다.
무작정 옆으로 손을 뻗어 무기가 될 만한 것을 들고 보니 예전에 받은 우수잠수사 표창장이었다. 지금은 과거의 영광이지. 상장케이스 모서리로 찍어봤자 별 도움은 안 될 거 같았다. 진짜 무기는 몽땅 방에 있는데! 텐타클 끊어내는 작살이며 나이프 등등…
“……”
해랑을 빤히 바라보는 청년의 눈동자가 유난히도 까맣고 깊었다. 해랑은 불청객의 눈에서 어떤 기시감을 느꼈다. 어디서 봤을까. 저 색…
그렇게 생각한 사이에 청년은 순식간에 달려와서
해랑을 확 끌어안았다.
해랑의 옷에 피가 묻었다. 누가 어디 다친 게 아니라 고기에 묻어있던 피다. 유연성도 모자라서 이젠 민첩성까지 떨어진 건가. 분명 온 신경을 청년에게 집중하고 있었음에도 눈 깜짝할 사이에 청년과 함께 뒤로 넘어지며 해랑은 스스로에게 혀를 찼다. 그래도 누구처럼 그 새까만 바닷속에서 죽는 게 아니라 다행인가.
아. 그제야 해랑은 자신이 느낀 기시감의 정체를 깨달았다.
알 수 없는 바다.
청년의 몸에 깔린 해랑이 가장 먼저 느낀 건 축축함이었다. 그리고 익숙한 비린내. 바다내음…
알 수 없는 바다의 색과 닮았다. 저 눈동자.
청년의 어깨 너머, 해랑의 눈에 들어오는 거실 천장만큼 정적은 새하얬고 반대로 해랑을 뚫어져라 내려다보는 청년의 눈동자는 금방이라도 그 속으로 잠수할 수 있을 것처럼 까맸다. 제 몸 위에 올라타 있는 것이 비록 인간의 모습을 하고는 있으나 인간은 아닐 것이라 해랑은 확신했다.
그렇게 탐색을 하던 청년은 해랑을 갑자기 꼭 끌어안았다. 그리고 해랑의 목에 제 얼굴을 부볐다.
“아, 아…”
청년의 입에서 처음으로 소리가 나왔다. 말소리는 아니어도 그것이 기분 좋음을 나타내는 소리임을 해랑은 느낄 수 있었다.
조금 이상한 표현일지도 모르겠으나, 청년은 해랑의 몸을 그렇게 한참동안 즐겼다. 옷 안으로 차가운 손이 기어들어오는데도 해랑은 반항도 못하고 그저 가만히 누워서 청년의 스킨십을 온전히 받아내고 있었다.
몸에 닿는 촉감은 축축하고 좀 차가울 뿐, 인간의 살갗과 똑같다.
이게 인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바다냄새가 지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