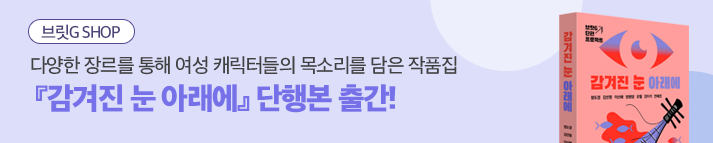망선요(望仙謠)
“너 또 봉산가 뭔가 그거 갔다 오니?”
“네, 좀.”
“손하구 어깨에 그거 뭐야? 더럽게…… 어이구, 산이라도 타고 온 줄 알겠네. 꼴 하구는. 코트 얼른 벗어서 내 놔라, 그거 드라이해야 되는데 세상에.”
“……내일 나가면서 맡기구 올게요.”
“내가 장보러 가면서 맡기지 뭐. 좀 앉아라. 멀뚱하니 서서 넋 빼놓고 뭐하니? ……그래서 봉사하는 건 재밌니?”
“그냥 그래요.”
“너 그거 뭐랬냐? 후배, 그…… 목포 산다던 걔가, 그.”
“지영이.”
“그래 지영이가 부탁한 거지?”
“갑자기 휴학한다고 대신 좀 가 달래서요.”
“몇 번이 아니구만. 일하느라 바쁜 애한테, 응, 걔는 참 하늘같은 선배더러 시키니?”
“겨우 뭐 일 주일에 한 번 가지고 왜. 인제 석 달인데.”
“지영이 걔가 사범대랬나? 선생님 한대?”
“화학과.”
“그러니까. 선생님 한대냐고.”
“아니.”
“안 하는 애가 웬 공부방인지 뭔지. 우리 때 야학 있던 거 그런건가?”
“비슷해요.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공부방. 아, 왜? 얘기 전에 내가 했잖아요, 계속.”
“궁금하니 그렇지. 엄마가 묻는데 너는 천날만날 짜증만 내구. 그래서 너 그거 쫓아다니고 회사는 어떤데? 할만 해?”
“응, 그냥. 뭐.”
“그냥 뭐, 뭐? 너 말 똑바로 하라고 내가 몇 번을 그래도 또 그러니?”
“그냥. 그냥 똑같다구, 매일. ……별로 잘 안 되는 거 같아. 확 관둘까.”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지. 넌 왜 그렇게 매사에 부정적이니?”
“…….”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엄마 우리 옛날에 살던 집 기억나요? 그 왜, 대우 다니는 아저씨네 집 밑에 있잖아. 반지하 거기.”
“거기가 왜.”
“공부방 하는 동네에 아직도 그런 집 많더라. 손바닥만 하게 빛 들어오고.”
“그러니까 느덜은 행복한 줄 알아라. 부모 잘 만나서…….”
“화장실 들어가는 데 높구.”
“옛날 집 그렇지. 다 이렇게 턱이 놓고, 응?”
“공부방 하는 데가 살림집 하나 빌려서 하는데, 거기 내가 좀 일찍 가서 서 있으면 여자애가 하나 빠끔하게 올려다보고 그래. 몇 번 눈 마주쳐서.”
“마주쳐서?”
“배우러 다니는 앤가 해서 보니까 아니야.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원래 집에서 잘 안 나온대. 학교도 잘 안 오고. 큰일이지.”
“에그. 그런 걸 부모가 챙겨야 되는데.”
“이름이 초희래. 부모 다 일 나가면 혼자 있나 보더라.”
“몇 살인데?”
“초등학교 삼학년인가. 아무튼 걔한테 초콜릿도 주고 저번에 껌도 주고 그랬는데. 처음엔 안 먹구 애가 숫기가 없더니 처음 한달 지나군가, 곧잘 받구 그러더라고요.”
“공부방이라도 오래지 왜. 안 온대?”
“오라고 또 그랬는데 안 와. 저번엔가, 언니, 하고 불러서 말을 못하는 앤 아니구나 하구 내려가서 집 안엘 쓱 봤는데 바로 보이더라. 화장실이 이렇게, 턱이 높은 거 보고 딱 옛날에 팔팔 올림픽 하구 그럴 때 우리 집 생각나서.”
“너 어려갖구 뭐 제대로 생각이나 나겠니? 이거 사과나 받어.”
“그때 엄마 밤 깎는 거 했잖아. 부업으루.”
“다 먹구 사느라 뭔들 안했니. 뜨개질도 하고 뭣도 하고. 어린 것들 덜렁 놓구 나갈 수가 없으니 맨 집에다가 들구 와서 하는 일. ……얼른 사과 먹어.”
“그만 깎아요.”
“이제 안 깎는다.”
“안 먹는다니까.”
“까 논건 먹어야지 너 먹으라고 깎아 논 걸 누가 먹니?”
“아, 정말. 옛날에 밤 깎다가 꼭 배부를 때만 요만큼씩 요만큼씩 잘라서 나를 주고. 왜 주는 걸 안 먹냐고. 아무튼 똑같애.”
“배 안 곯으라고 그러지, 엄마가.”
“엄마가 밤 깎다가 벌레 먹은 데나 그런데 있으면 쓱 베서 먹구 그랬잖아. 그거 내가 보고 있었던 거 기억나는데. 맨 쪼그만 것만 줘서, 그래서 내가.”
“테레비 틀어봐라. 뭐 하나.”
“내가 왜 큰 거 먹으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그건 파는 거라구 먹으면 안 된다고. 엄마가. 이만한 그릇에다가 물 받아서 거기 밤 담가놓구. 기억 안 나? 응?”
“기억 나, 기억 나. 왜!”
“초희말야.”
“초희?”
“엄마 내 얘기 안 듣지.”
“듣잖아. 얘가 왜 짜증이야?”
“그래, 초희가.”
“그래그래. 쪼꼬렛 받은 애. 너 공부방 가는데 옆에 걔가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