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내가 글을 썼던 적이 있구나, 기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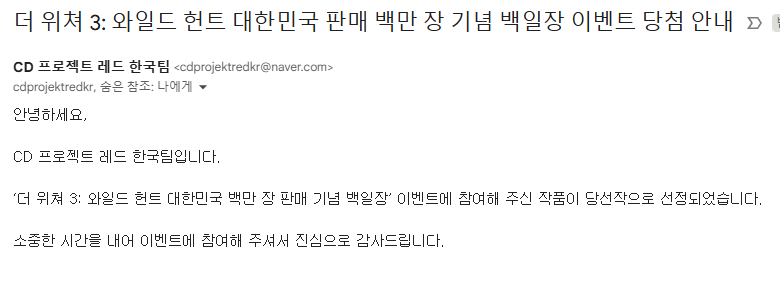
제 ‘인생게임’ 리스트에 들어가는 게임 중 하나가 위쳐 3입니다.
게임 자체 인기는 워낙 높았고(그 해를 상징하는 게임으로 여겨지는 최다 GOTY에 등재된 게임입니다), 제가 직접 모은 돈으로 산 첫 번째 컴퓨터로 돌렸던 첫 번째 게임이기도 하지요.
여태까지 제가 즐겼던 선택지 중심 게임은 최선의 선택과 실수하거나 뭔가를 놓치면 나쁜 결과로 이어지는, 일종의 심리적 루트가 정해진 게임이었습니다. 개발사는 여러 길을 뚫어놨다고 여기지만 게임을 하는 유저는 수많은 엔딩 중 ‘진엔딩’을 스스로 정의하고 그 루트를 쫓아가는 일이 빈번했지요.
그런 좁은 세상밖에 모르던 저에게 위쳐는 충격이었습니다. 주인공부터 길 가다가 침을 맞아도 누구도 뭐라 하지않는 일종의 ‘잡종 인간’이었고, 어디선가 들어보셨을지 모를 ‘붉은 남작’ 퀘스트의 마지막 부분의 결말을 보며 여태까지 제가 했던 선택지를 고민하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을 정도였습니다.
“완벽한 선은 없다”라는 게임의 주제를 명확하게 초반부터 밝혔기 때문에 위쳐에서 만나는 매 선택지는 고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이걸 받아들이면 전에 내가 도왔던 은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가? 그렇다고 이걸 거절하면 이 사람이 죽을지 모르는데? 저울의 무게를 쉴새없이 흔드는 아주 훌륭한 게임입니다.
그 게임이 이번 년도에 국내 판매 100만장을 달성해 소소한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위쳐백만장”으로 오행시를 짓는 것이었죠. 워낙에 게임을 좋아해서 이벤트 보상이고 뭐고 신경도 안 쓰고 일단 써봤습니다. 글을 놓고 살다 간만에 쓰려니 고작 150자 채우기도 벅차더군요. 사실은 넘쳐서 줄여야 했던 거지만.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안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400여명 중 100명이나 추첨하는 거라 제 글이 무척 빼어났다, 라고 자뻑은 못합니다만 그래도 수상한 게 어딘가 싶습니다. 제가 썼던 글을 까먹어 나중에 공식 사이트에 제가 썼던 글을 올려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쳐 홍보를 했으니 여러분들에게 위쳐를 적극 추천드리고 싶으나… 이게 전투 시스템이 참 거시기합니다. 3D 멀미가 있으신 분도 하기 힘드실 거고요. 그래도 소설이 원작이니 소설이라도 읽어보시길.
———-
쓰고나니 글을 이렇게 나누는 게 더 읽기 좋겠다 느껴집니다. 그래서 나눴습니다.
글을 놓고 있는 건 현생이 바쁜 것과 예전보다 덜 고통스러운 상황이 됐다는 것(환경이 격변했지만 오히려 더 나아진 기분입니다. 일단 기분은요)이 크겠습니다. 고통에서 예술작품이 나온다더니 정말 좀 살만해지니 글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잊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 외에도 심리적인 걸림돌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어떤 분이 저에게 날린 평가였습니다. 상처입는다며 말하지 않겠다 했지만 판도라가 어디 상자를 가만 놔뒀습니까, 말해달라 부탁했죠. 답변은 단순한 원색적 비난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넌 가슴을 쥐고 흔드는 글을 못 써. 글을 논리로 쌓아 올리거든.”
아! 이런 미친! 끔찍한 현실이면서 제가 왜 다른 사람보다 글을 못 쓰는 것 같았는지 깨닫는 한마디였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독서량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여러 사이트와 브릿G에서 다양한 글을 읽어봤고, 그 중에는 그 커뮤니티에서 인기가 많은 글도 물론 있었습니다. 한 수 배우고자 찾아서 읽어봤죠. 근데 이게 참… 오만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지 납득되지 않는 것들도 많았습니다.
차라리 읽었더니 별로고, 나도 별로면 서로 일치되니 납득이라도 하겠습니다만, 간혹 문체가 정말 엉망인데도, 이게 재밌다고 느껴서 계속 읽고 점차 가속도가 붙는 글도 있었습니다. 읽으면서도 이상했죠.
‘이런 게 왜 재밌지? 왜 계속 읽고 싶어지지?’
오랫동안 자문하며 답을 찾으려 했지만 실마리 하나 찾지 못했던 그것을, 그때 깨닫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있는 벽이 더욱 선명해졌죠. 사람을 흔들지 못하는 차가운 글, 아무리 꾸며봤자 한낱 진동에 불과한 그런 부동의 글. 안개가 걷히고 드러난 건 비포장 도로도 아니고 칠흑같은 높다란 벽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글 쓰는게 더 무서워지덥니다. 네온 그린 크리스마스 소일장에도 제 요즘 취향인 사이버펑크를 한껏 담아내고 싶은데 아무런 스파크가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넘어서지 못한 스스로가 안타깝습니다.
———-
울적한 이야기가 중간에 들어갔지만, 지금은 잠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상 탔잖아요?
지금은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만 그래도 과거엔 뜀박질이라도 했다고 자부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이번 일은 그 시간의 흔적을 잠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과거는 결국 쌓여 지금을 만든다는 게 이런건가 싶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