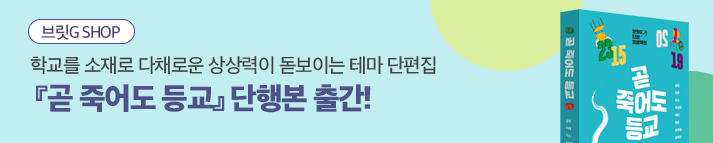1.
학급 회의에 선생님은 없었다.
다른 선생님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교실에서 회의를 주재했지만, 2반 선생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학급 회의는 너희들 몫이니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이끌어야 한다며 선생님은 매번 자리를 비켜주었다.
어른의 개입이 없다고 회의가 자유롭게 흘러가는 건 아니었다. 어차피 학교생활이라는 건 늘 비슷해서 신선한 안건이 올라올 여지가 별로 없었다. 정해진 순서라는 게 있으니 그에 따를 따름이었다.
성재는 교탁 앞에서 프린트 물을 줄줄 읽었다. 5학년에 올라와서 어쩌다 보니 반장이 되긴 했지만 두 달이 지나도 여전히 아이들 앞에서 무언가를 말하는 것은 겸연쩍은 일이었다. 친구들끼리 ‘아무개 어린이’라고 부르는 게 웃기기도 했고,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아서 더욱 힘이 빠지는 것도 있었다.
이 날도 그랬다. 그 안건을 올리기 전까지는.
“이어서 각 부 활동 계획이 있겠습니다. 부장들은 나와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물을 잘 챙겨오고 복도에서 뛰지 맙시다. 선생님을 마주치면 예의 바르게 인사합시다.”
발표라고 해 봐야 열 개 정도의 생활 목표를 섞어서 매번 두어 개씩 말하는 정도였다. 생활부장의 발표가 끝나자 부반장이 나와 다음 주의 실천 목표를 이야기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항상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대강의 순서가 끝나자 성재는 벽에 걸린 시계를 보았다. 아직까지 쉬는 시간이 되려면 15분 쯤 여유가 있었다.
“선생님 말씀이 있을 때까지 시간이 약간 남았는데요. 아마 10분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재는 문 쪽에 앉아 있는 아이에게 눈짓을 했다. 선생님이 오시면 알려 달라는 신호였다.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는걸 보며 성재는 분필을 들었다. 이런 걸 대놓고 얘기한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너무 이상했지만, 이제 와서 돌이킬 수는 없었다.
귀신.
칠판에 쓰인 두 글자를 보는 순간 교실에 정적이 감돌았다. 입에서만 오르내리는 것과 이렇게 공식화를 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다.
성재는 잠시 심호흡을 하고서는 말을 이었다.
“이제부터는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 어쩌다 보니까 여기서 다루게 됐는데, 이건 공식 안건은 아니야. 여기서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고. 기록도 안 남을 거야. 따로 얘기하면 좋겠지만 이런 자리가 잘 없으니까.”
성재는 반 아이들을 둘러보았다.
“바로 물어볼게. 여기서 귀신 한번이라도 본 사람 손들어.”
아이들이 드문드문 손을 들었다. 정원 스물다섯 명 중에 여섯 명. 적지 않은 숫자였다. 성재는 손을 든 아이들의 눈을 한 번씩 보았다. 그 중에는 평소 장난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도 섞여 있었다. 헛소문을 내거나 거짓말을 할 아이들이 아니었다.
성재는 그 중에 한 아이를 지목했다.
“여섯 명이 본 걸 다 들을 수 없으니까, 은미 얘기만 들을게. 얘기해 봐. 언제 어디서 봤는지.”
“지난주 화요일이었어.” 은미가 입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