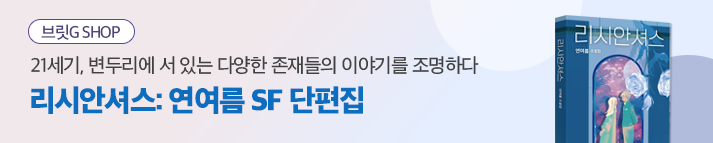동시다발적인 테러였다.
소난의 발바닥이 우르릉 진동했다. 한창 비트에 달아오른 공연장의 무대에서 느껴지는 진동보다 몇 배는 강력한 울림이었다. 열광 섞인 환호성 대신 절규와 비명이 겹을 이뤄 소난의 귀를 감쌌다. 이어서 몇 종류의 사이렌 소리가 그 틈에 섞여들었다.
지진일까 싶어 순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몸을 낮췄지만 그 이상의 진동은 없었다. 갑작스러운 진동에 잠시 멈춘 걸음을 다시 떼기 시작하자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폭탄이래. 폭탄. 사이드 아웃이야. 또 사이드 아웃이야. 여기뿐이 아니야. 본드 스트리트역에서도 터졌대. 유스턴역에서도. 빅토리아 쪽에서도.
소난의 걸음에 속도가 붙었다. 느낌상 폭탄이 터진 지점은 이곳에서 그리 멀지 않다. 동시다발적인 테러라면 언제 어디서든 또 하나 터져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뜻이기도 했다. 어디도 안전하지 않다. 소난은 당장 패스파인더pathfinder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당장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본능 위로 다른 염려 하나가 내려앉았기 때문이다. ‘빅토리아 쪽에서도’ 라는 말. 빅토리아라는 동네가 결코 손바닥만 한 사이즈는 아니지만 그래도 패스파인더가 있는 곳이다. 그곳이 무사한지 눈으로 확인해야 했다.
도로는 엉망이었다. 긴급 운행 중지로 멈춘 전철, 버스, 택시에서 쏟아져 나온 인파가 거리 가득이었다. 몇 걸음 간격으로 자신을 픽업해 달라고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을 지나치며 소난은 달렸다. 이 속도라면 십 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등에 매달린 기타의 무게가 두 다리에 중력을 더했지만 날개라도 단 듯 질주했다.
드디어 패스파인더가 있는 길목에 도착했다. 그러나 이곳도 온통 사람들이었다. 역시 긴급 운행 중지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길을 꽉 메우고 있었다. 어디쯤에서 폭탄이 터진 건지 하늘이 온통 까맸다. 패스파인더는 불과 이십 미터 앞에 있는데 시야에는 우왕좌왕하는 사람들과 혼탁한 하늘만 들어올 뿐이었다.
“좀…… 비켜주세요.”
소난은 가쁜 숨을 진정시키며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처럼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아갔다. 느린 속도로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인파의 모양이 변했다. 소난과 반대 방향으로 제 길을 향해 가려는 사람들을 모두 거치자, 이제는 어느 한 곳을 둥글게 둘러싼 무리가 나타났다. 마치 소난이 거리에서 버스킹을 할 때 하나둘 모여든 관객들처럼. 이들이 보고 있는 것은 뭘까.
답은 멀리 있지 않은 것이 분명했고, 패스파인더에 가까워질수록 힌트도 빠르게 쌓여갔다. 처음엔 소방대원 유니폼을 입은 남자였다. 그다음은 경찰의 무전 소리. 그다음은 들것에 실린 머리를 다친 누군가와 응급구조대원들. 그리고 점점 진해지는 매캐한 냄새. 소난이 다가가는 것보다 몇 배는 빠른 속도로 탄 냄새가 소난을 침투해왔다.
“펍Pub에서 터졌어요!”
“사망자는요?”
“비켜주세요! 모두 집으로 돌아가세요!”
“가까이 오면 안 됩니다.”
서로 다른 음색과 억양이었지만 날카롭고 예민한 것만은 모두 같은 목소리의 끝에서 소난은 드디어 걸음을 멈췄다. 더 이상 나아갈 앞이 없었기 때문이다. 물세례에 한 풀 꺾인 낮은 연기가 패스파인더를 자욱하게 둘러싸고 있었다.
“젠장. 이게 뭐야.”
소난은 망연하게 중얼거렸다. 한 시간 전만 해도 펍은 손님들로 평범하게 복작이고 있었는데 끊어진 기타 줄을 교체하러 다녀온 사이에 생겨난 일이다. 마침 그때 그곳에 있지 않았던 게 천운이라면 천운이지만, 믿을 수 없었다. 이럴 수 없었다. 아니, 이래서는 안 된다. 패스파인더는 통로다. 소난이 돌아가야 할 통로. 원래의 제 우주로.
탈의실이 무사한지 봐야 했다. 소난은 접근금지 테이프를 들어 올렸다. 탈의실이 괜찮은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다. 바로 허리를 숙여 통과하려는데 기타 목 부분에 테이프가 걸렸다. 자세를 고쳐 빼내느라 조금 시간을 잡아먹은 사이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머리 위에서 들려왔다.
“어이어이, 아가씨. 안 돼.”
넘어왔다고 생각한 접근금지 테이프는 다시 소난의 눈앞으로 둘러쳐졌고, 머리가 희끗하고 푸른 눈에 풍채가 큰 남자 경찰이 팔짱을 끼며 앞을 가로막았다.
“여긴 테러 현장이야. 아가씨도 빨리 집으로 돌아가. 오늘은 돌아다녀서 좋을 게 없어.”
낮잡아보는 말투가 불쾌했지만 검은 눈에 검은 머리카락의 왜소한 동아시아인의 외모로는 종종 경험하는 일이었기에 면역이 전혀 없진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비상사태다. 나쁜 기분은 조금 미뤄놓을 수 있다.
“줄리안이 무사한지 봐야 해요!”
“줄리안?”
“펍 주인이요.”
펍 주인이라는 말에 경찰은 미간을 움찔했다. 무언가 알고 있는 게 분명했다. 이제 그에게 귀찮게 알짱대는 이방인을 대하던 눈빛은 사라지고 단순한 연민이 차올랐다.
“아가씨, 유감이야.”
그가 도리질하며 말을 이었다.
“그 사람은 가능성이 없을 거야.”
“네……?”
“가장 먼저 구조되긴 했는데, 하늘만 알겠지.”
“…….”
떠날 때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
이제 더 이상 그것이 거기에 있지 않을 때. 또는 그 사람이 거기에 있지 않을 때 더욱 선명하고 분명해지는 것들.
소난은 줄리안이 없는 잿빛이 된 패스파인더를 보며 이곳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