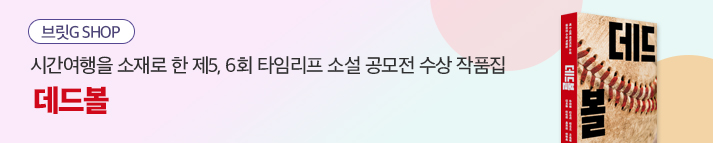1.
이건, 내가 어떻게 이름을 얻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야.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나니까 먼저 내 소개부터 할게.
사실 나는 이름이 아주 많아. 그러지 않기 힘든 묘생猫生이지. 길고양이거든. 나는 단 하루 동안에도 아주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이 나를 부르는 이름도 아주 다양해.
대체로 인간들은 나를 ‘야옹아’ 내지는 ‘고양이야’ 라고 부르지만, 면식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이름을 붙이는 사람들이 꽤 있어. 치즈야, 인절미야, 누룽지, 감자야. 색깔만 보고 대충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갖다 붙이는 경우가 많아.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은 결코 아닌데 말이야. 인간이란 다소 자기중심적이야. 아니면 상상력이 부족하다고 해야 할까. 뭐, 그들의 잘못은 아니지. 완벽한 종족이란 없으니.
아무튼 승주가 내 눈에 들어온 건 그런 이름이 아닌, 특이한 이름을 나에게 불러줬기 때문이야. 겸사겸사 이 이야기의 조연을 소개하지. 나승주. 여성. 이십구 세. 배우 내지는 무명배우. 어느 쪽으로 불러도 좋다고 했어.
아,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딱히 길집사들의 신상에 관심이 있는 편은 아니야. 길집사라는 단어에서 이미 눈치를 챘는지도 모르지만, 나에게 그들은 한 덩어리나 다름없어. 그들이 나에게 ‘야옹아’이듯, 나에게 그들은 ‘길집사야’ 정도인 거지.
그들 개개인이 누구인지 이름은 뭔지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 내겐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야. 날 괴롭히거나 쫓아내지만 않는다면 적당히 ‘야옹’ 소리를 들려주며 잘 지내는 데 지장은 없으니까. 뭐랄까. 길집사는 내게 소통해야 할 대상이라기보다 환경에 가깝지. 내가 이 지구별에서 한 묘생을 지내는 데 불편함이 덜하도록 먹을 것과 몸 뉠 곳을 제공해주는.
승주는 나를 ‘이소야’라고 부르며 츄르를 흔들어 보였어. 우리의 첫 만남이었어.
불광천 둔치 높다란 곳의 한구석, 나를 ‘감자야’라고 부르는 길집사 중 하나가 만들어준 나무상자집이 있는데, 그 위에 올라가 늘어지게 누워 서늘한 초여름 밤바람을 모처럼 만끽하던 중이었어. 내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심긴 캐트닙Catnip의 향이 솔솔 풍겨 와서 마침 기분이 좋았거든. 오늘은 길집사들에게 사료도 간식도 넉넉히 얻어먹어서 배도 부르고 말이야. 승주가 그 와중에 끼어든 거야. 눈치도 없지.
그런데 건방지다고 해야 할까 대담하다고 해야 할까.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닭 가슴살 맛 츄르를 팔랑거리며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이름으로 날 유혹하려고 하더라고. 인간이라면 어처구니가 없다고 웃었을 거야. 나는 웃음소리를 낼 수는 없으니, 뾰족한 송곳니를 드러내며 긴 하품을 하곤 폭신한 두 손 위에 턱을 올려놓고 눈을 감았어. 나는 너에게 관심이 없다는 의향을 온몸으로 전달하면서. 치즈도 감자도 누룽지도 아닌 이름이 약간 신선하긴 했지만. 그래도 닭 가슴 살은 좀 아니거든.
“야, 이소야.”
열 번쯤 불러도 꿈쩍 안 하면 그냥 퇴장할 만도 한데 승주 이 녀석은 좀 끈질겼어. 아니나 다를까, 바람이 방향을 바꾸자 맥주 냄새가 나더라고. 여름밤이라, 인간들이 맥주하기 좋은 계절이긴 하지. 이 둔치에도 삼삼오오 모인 자리에 푸쉭거리며 맥주 캔 따는 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려. 오늘은 미세먼지 주의보 때문에 한산한 편이었지만.
“뭐야, 이름이 별로 맘에 안 드나?”
승주는 츄르는 그만 제 에코백에 챙겨 넣고는 상자집 곁에 털썩 엉덩이를 내려놓았어. 내겐 좀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화들짝 놀라 털이 바짝 곤두서고 말았지. 나는 얼른 상자집 위에서 뛰어내려와 승주와 적당한 거리를 벌렸어. 그런데 내가 자리를 비우자 승주는 내 상자집 위에 턱을 괴고 기대는 게 아니었어? 푸- 한숨을 쉬면서.
“이-야옹!”
항의의 뜻으로 크게 울어보였는데 소용이 없더라고. 비킬 생각이 없어 보였어. 무례하지 참. 그리고 곧 시작된 것이 승주의 자기소개야. 이쪽에서 부탁한 것도 아닌데 말이야. 내가 승주의 신상을 알고 있는 건 그 때문이야. 승주는 자기 이름은 뭐고, 어디 살고, 몇 살이고 주절주절 신상을 읊더니 신세한탄도 덧붙였어.
“이번 오디션도 말아먹고 말이야. 아, 내가 배우거든? 누구나 알만한 작품에 출연한 적은 없지만…… 무명이지만. 그래도 배우는 맞다고.”
인간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 술을 마시곤 하던데, 승주가 오늘 맥주를 마신 이유는 후자 같았어. 아, 그렇다고 내 집을 제가 독차지하고 끌어안고 있는 걸 용서한다는 뜻은 아니고. 빨리 좀 비켰으면 했는데, 이제 승주는 팔꿈치 굄용이 아닌 양팔로 내 집을 끌어안은 채 온 상반신을 의지하고 있었어. 착 달라붙는 복장에 기다란 카디건만 대충 걸친 모양을 보아하니 인간들이 좋아하는 ‘요가’를 하다 온 것 같은데, 운동하고 맥주 마시는 거 효과 없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말이야.
인간은 모순덩어리긴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