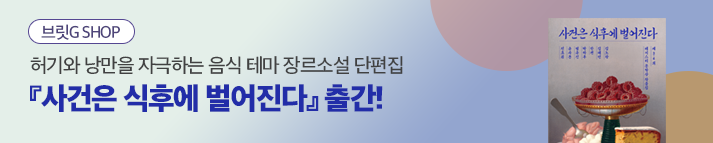이막손 씨는 의료폐기물 상자를 헤집다가 나에게 걸렸다.
못 본 척 퇴근이나 할 걸.
예전에 막손 씨가 일회용 포셉을 한 번 쓰고 버렸다고 부장에게 욕먹고 쓰레기통을 뒤지던 게 기억나, 안쓰러운 마음에 다가간 게 실수였다.
-막손 씨, 뭘 그렇게 찾아요? 또 부장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어두침침한 비상계단에 한 발짝 들어섰고.
눈이 어둠에 익숙해졌을 때.
의료폐기물 상자를 파헤쳐, 다 쓴 혈액투석기 필터를 쪽쪽 빨아먹고 있던 이막손 씨를 마주했다. 핸드타월과 필터 포장지와 다 쓴 주사기가 굴러다니는 가운데, 빠르게 굳어 가는 피 섞인 투석액을 단 1cc라도 빨아먹으려 들던 막손 씨의 몰골은 다시 잊지 못할 모습일 것이다.
그때 피에 젖은 얼굴을 보며 내가 처음으로 느낀 감정이 역겨움도, 두려움도 아닌 측은함이었다는 것까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