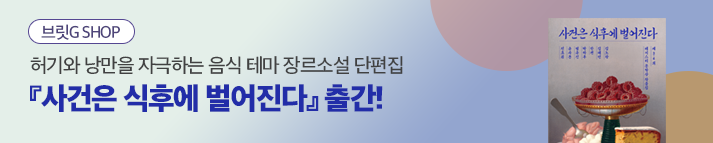여자에게 시선이 간 건 지루해서였다. 애초에 잘 될 수가 없는 소개팅이었다. 나는 남자의 외모가 마음에 안 든다는 티를 팍팍 냈고, 내 앞에 앉은 남자는 부모에게 등 떠밀려 나왔다는 오오라를 전신에서 뿜어내고 있었다. 그래도 나와 남자는 소개팅의 정석을 차근히 밟아 스파게티와 리조트를 주문했고, 적당히 가식을 떨며 서로의 신상을 캐물었다. 말이 소개팅이지, 주선자가 서로의 고모와 엄마인 이상 선 자리나 다름없었다. 소개팅 남은 주구장창 인터넷에서 본 막장 연애 스토리를 읊어댔다. 아무래도 이 자리를 잘못 끝내면, 나와의 만남을 막장 소개팅 스토리로 각색해서 올릴 것만 같았다. 고모에게 잔소리를 듣는 것도, 인터넷 썰의 주인공이 되는 것도 노땡큐였다. 그러니 참자, 싶었다. 다행히도 41층에 자리잡은 라운지는 비싼만큼 밥이 맛있지는 않았지만 썩 괜찮은 야경이 내려다 보였다. 나는 상대의 말을 한 귀로 흘러들으며 소개팅남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야경으로 지루함을 견뎠다.
야경은 역시 도시의 것이 좋다.
도시의 야경을 구성하는 많은 깜박이 전구들은 야근에 시달리는 회사원과 교통체증에 시달리며 차 안에서 참을 인 자를 새기는 사람들이다. 나 역시 원래는 깜빡이 전구지만, 일순간 전구 무리에서 벗어나 전구를 감상하는 위치가 된다. 순간의 전복. 그러나 곧 전구로 돌아갈 것을 알기에, 그 아름다움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
무너질 것이 예정된 아름다움. 그것만큼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없다.
“심부름센터 운영이요? 제가 아는 그 심부름센터……?”
“맞아요. 아, 전 미행 이상 범법행위에 접촉되는 의뢰는 안 받습니다.”
“여자가 하기엔 좀 험한 일 아닌가요.”
남자의 말에 지루함이 60%증가했다. 더 이상 야경으로는 커버가 안 되겠다 싶어, 무슨 핑계로 삼분의 이나 남은 식사를 남기고 이 자리를 떠날까 머리를 굴리던 때였다. 나와 대각선 자리에 앉은 여자가 가방에서 립스틱을 꺼내는 것이 눈에 띄었다. 백 미터 밖에서도 알아볼 수 있는 브랜드 로고가 선명히 박힌 립스틱은, 내가 살까말까 망설이고 있던 신상이었다. 남의 발색 샷을 보는 건 언제나 재미있는 법이다. 하물며 지루함에 몸부림치던 때에야 두말 할 필요가 없다. 나는 스파게티를 부지런히 입으로 옮기며, 계속해서 여자를 훔쳐봤다. 여자는 립스틱을 무척 천천히 발랐다. 연분홍색 립스틱이 여자의 입에 닿아 선명한 빨간색으로 변하는 순간, 내가 손에 쥐고 있던 포크에서 스파게티 면이 후드득 떨어져 내렸다.
찍고 싶었다. 저 여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