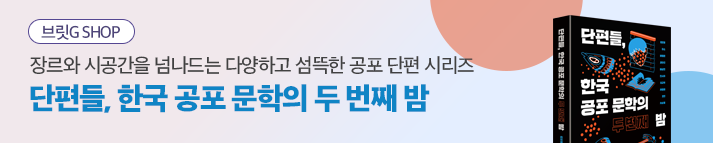1.
하늘을 가득 채운 거대한 달을 보고 드는 생각은 하나였다. ‘아, 이거 꿈이구나.’
옆에 누워 있는 할머니가 드르렁 코를 골았다. 뒤돌아 있는 작은 몸이 오르락 내리락했다. 자고 있는 할머니를 깨우지 않으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섰다.
시골의 풍경은 시린 푸린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나는 콩밭과 논을 지나 걷고 또 걸었다. 마을 끝자락 쯤 왔을까, 갑자기 담장 뒤로 숨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아무 집에나 들어가 담장에 바투 붙어 숨었다.
‘자박, 자박’
담장 너머로 발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고개를 빼꼼 내밀어 발소리의 주인공들을 훔쳐보았다.
인적 없는 시골길을 걷고 있는 두 사람 중 한 명은 내가 아는 사람이었다. 마을 건너에 사는 장군이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마치 널을 뛰는 것처럼 펄쩍 펄쩍 뛰고 있었는데, 흐느적거리는 팔이 하늘 위로 솟았다, 떨어졌다 했다. 어찌보면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마치 실이 끊어진 인형을 마구 흔드는 모습 같기도 했다.
“히히히.”
장군이 할머니가 웃기 시작했다. 자세히 보니 함박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이, 여간 오싹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었다.
할머니의 옆에서 걷고 있는 사람을 보자 나의 공포감이 극에 달했다. 그의 키는 2미터가 족히 넘어 보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새까맸다. 몸 중에서 유일하게 하얀 곳이라곤 눈 뿐이었는데, 검은 눈동자가 없는 두 눈엔 흰자만 가득했다. 그는 웃으며 펄쩍 뛰는 장군이 할머니 옆에서 묵묵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나는 비져나오려는 신음을 억지로 참았다.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싶어 몸을 조심히 움직였다. 나는 천천히 한 발자국을 내딛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다음…
네 번째 발걸음을 디디려 할 때, 간드러지는 웃음 소리가 멎은 것을 깨달았다. 뒤를 휙 돌아보자 검은형체의 사람이 나의 앞에 서 있었다. 큰 키로 구부정하게 서서 나를 바라보는, 보랏빛 핏줄이 만연한 하얀 두 눈. 그가 씩 웃자 시뻘건 입 속이 훤히 벌어졌다.
나는 도망치지도 못한 채 바닥에 철퍽 엎드려 속으로 빌었다. 하나님, 부처님, 제발… 이 꿈에서 깨게 해주세요. 맞잡은 두 손에 땀이 흥건하게 차올랐다. 바닥에 찧은 무릎의 끔찍한 고통이 온 몸으로 퍼져나갔다. 제발… 제발요…시간이 얼마정도 지났을까. 나는 겨우 고개를 들었다.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고,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는 푸른 달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나는 뛰었다. 꼴딱꼴딱 숨이 넘어갈정도로 달리고 달려 집에 도착했다. 그리고 떠날 때와 마찬가지로 같은 자리에 누웠다. 두 손을 꼭 모으고 제발 꿈에서 깨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옆자리엔 뒤 돌아 누워 있는 할머니가 푸푸 소리를 내며 잠꼬대를 해댔다.
그 때, 갑자기 거실의 불이 탁 켜지며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자기 전에 수박을 너무 많이 먹었다는, 여름이 되면 귀에 딱지가 않을 만큼 많이 듣는 할머니의 투정이 열린 문 틈 사이에서 들려왔다.
그렇다면, 내 옆에 자고 있는 이 할머니는…
“아…아…”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고개를 돌려 할머니의 정체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얼어버린 몸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 꼭 모은 두 손이 새하얘질 정도로 꽉 쥐었다. 옆에 누워 있던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났다. 장군이 할머니가 나를 향해 예의 미소로 활짝 웃고 있었다.
“히히히. 이히히히.”
그 다음은 기억나지 않는다. 까무룩 기절했던 것인지,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에 뜬 후 였다.
“어여 인나. 언제까지 잘거여!”
할머니가 나의 등을 두드려 깨웠다. 으응? 나는 신음인지 뭔지 모를 소리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바빠지게 생겼응게, 일어나서 같이 나가자.”
“어딜?”
이미 외출준비를 마친 할머니가 앞섬을 매만지며 말했다.
“어제 장군이 할머니 돌아가셨댄다.”